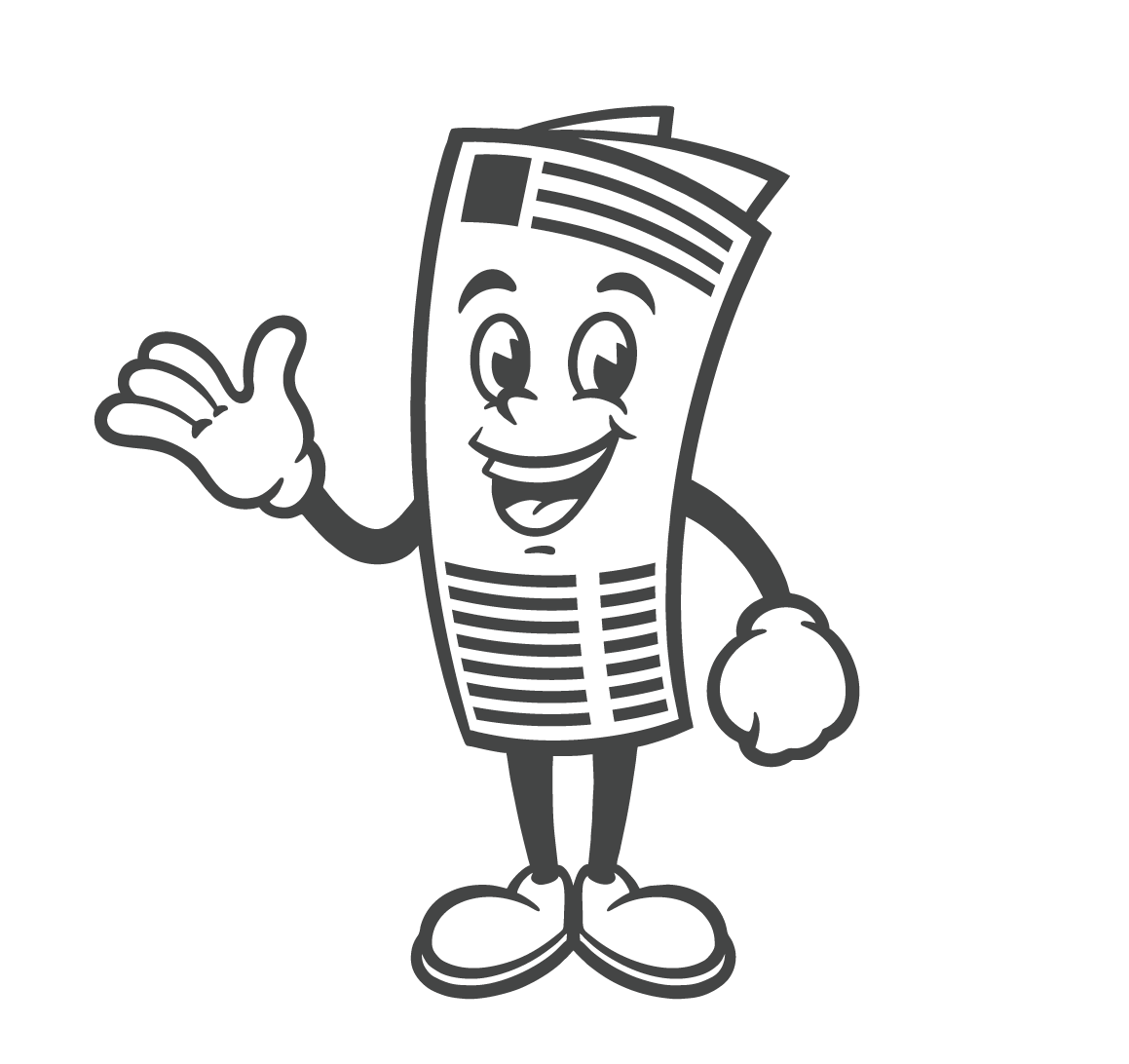치매·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과 발전 가능성 상승
현대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조차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한 갈증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천연물 ‘허포트리콘’을 세계 최초로 합성하며,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의 현재 상황과 한계, 그리고 허포트리콘을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의 과제와 필요성
치매와 파킨슨병은 인구 고령화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 현재 치매(알츠하이머형 포함)는 유병률이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시급합니다.
- 파킨슨병은 알파시뉴클레인 축적과 신경세포 손상, 교세포 기반 신경염증 반응이 병리적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기존 약물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신경세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치료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신경염증 억제 신약, 항신경염증 물질 기반 치료제, 신경세포 보호 메커니즘 기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 연구 커뮤니티에서 핵심 과제입니다.
2. 허포트리콘의 등장: 세계 최초 합성과 의미
최근 KAIST 한순규 교수 연구팀은 ‘허포트리콘(herpotrichone) A·B·C’의 세계 최초 화학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물질은 기존에는 콩벌레 공생 곰팡이에서 극미량만 추출되던 희귀 천연물로,
- 뇌 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 철분 매개 세포 사멸(ferroptosis)을 차단하며,
- 신경세포 보호 효과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화합물이 아니라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후보 물질로서 매우 높은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3. 합성 기술과 과학적 접근
- 연구팀은 딜스-알더(Diels–Alder) 반응과 수소결합(H‑bond) 설계를 정밀하게 조율해,
- 복잡한 6/6/6/6/3 다중 고리 구조 구조를 갖는 허포트리콘 A·B·C 모두를 정확하고 높은 수율로 합성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자연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신규 분자 구조들도 동시에 얻었으며,
- 일부는 약리 활성 가능성을 지닌 신규 천연물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성 성공은 단지 희귀 천연물을 실험실에서 재현한 것 이상으로, 천연물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치매·파킨슨병 치료제 발전에 주는 기회와 의미
4‑1. 항신경염증 치료제 기반 확보
허포트리콘은 뇌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작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물질로, 기존의 증상 완화 중심 치료제와는 다른 병인 기반 치료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4‑2. 양산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자연 추출이 아닌 화학적 합성 방법이 확보됨으로써,
- 실험 연구용 시료 확보,
- 전임상 및 임상시험용 물질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 산업화 가능성이 크게 열렸습니다.
4‑3. 새로운 후보 신약 물질 발견
합성 과정에서 얻어진 신규 구조 분자들은 이후 생체 내 약리 활성 평가를 통해 치매나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군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 이는 허포트리콘 자체를 넘어 더 다양한 신경보호 물질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5. 추가 연구 과제와 향후 방향
• 전임상 및 임상시험 진입
허포트리콘의 안전성, 생체 내 약동학, 약효 등을 평가하는 전임상 연구가 시급합니다.
이어 임상 1상, 2상 등의 순차 검증을 통해 치매·파킨슨병 환자 대상 치료제 후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유도체 설계 및 구조 최적화
기본 구조에서 효용을 높이거나 독성을 낮춘 허포트리콘 유도체(with structural modifications) 설계와 합성 연구가 필요합니다.
• 국제 연구 협력 및 기술이전
KAIST·제약기업·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이전, 공동 임상, 글로벌 상용화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KAIST와 바이오기업 HLB의 협업 사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신약 플랫폼과의 융합
예를 들어 RNA 편집 억제 기반 신경염증 조절 연구(ADAR1 연관)와 허포트리콘 기반 항염증 물질 연구를 결합하면 뇌질환 치료제 다중 타깃 접근이 가능합니다.
뇌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
KAIST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허포트리콘을 인공 합성한 성과는,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자연계에서 구하기 어려운 항신경염증·신경세포 보호 물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신약 연구 및 생산 기반을 마련한 만큼, 향후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주목됩니다.
또한 허포트리콘의 구조 기반으로 신규 약물 설계 및 다중 타깃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충청일보, “KAIST, 뇌 질환 치료물질 ‘허포트리콘’ 세계 첫 합성 성공” Veritas A+8KAIST News+8KAIST+8KAIST News+10CC Daily News+10조선일보+10Nate News+3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3아시아경제+3유튜브+6Veritas A+6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6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2아시아경제+2다음+2
- 전자신문, “KAIST, 신경염증 억제 ‘허포트리콘’ 세계 최초 합성…뇌질환 신약 개발 기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 아시아경제, “희귀 천연물 ‘화학합성’ 성공…KAIST ‘파킨슨병 등 치료제 개발 기대’” 다음+2아시아경제+2Nate News+2
- 동아사이언스, “韓·英 공동연구팀, 파킨슨병 새 치료전략 제시 (RNA 편집 조절)” 동아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