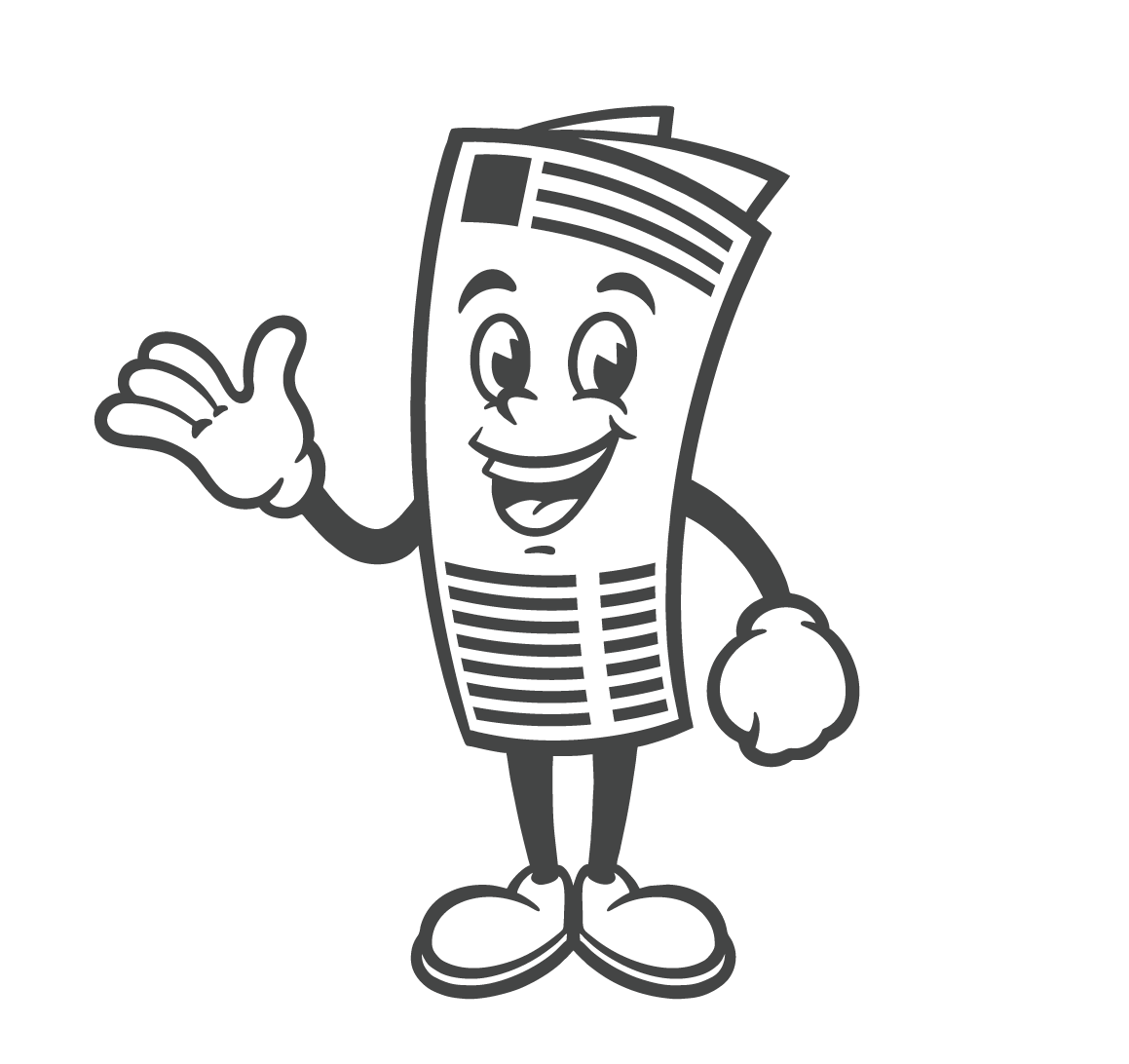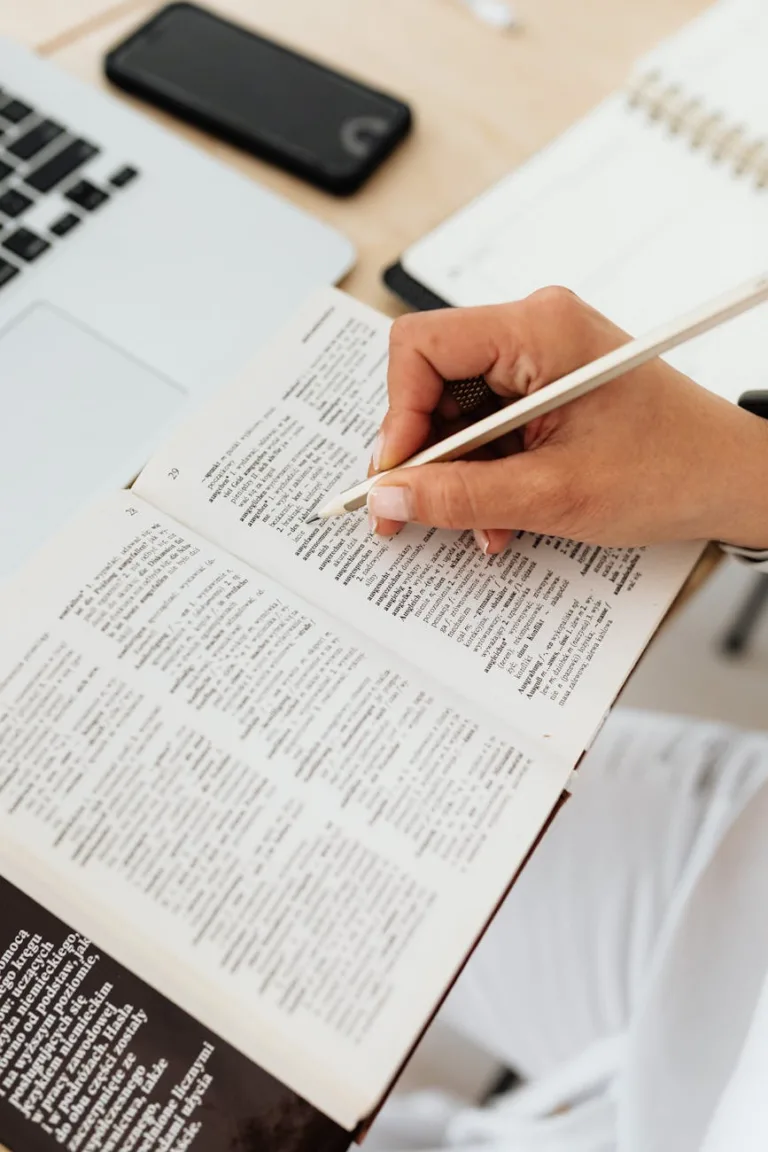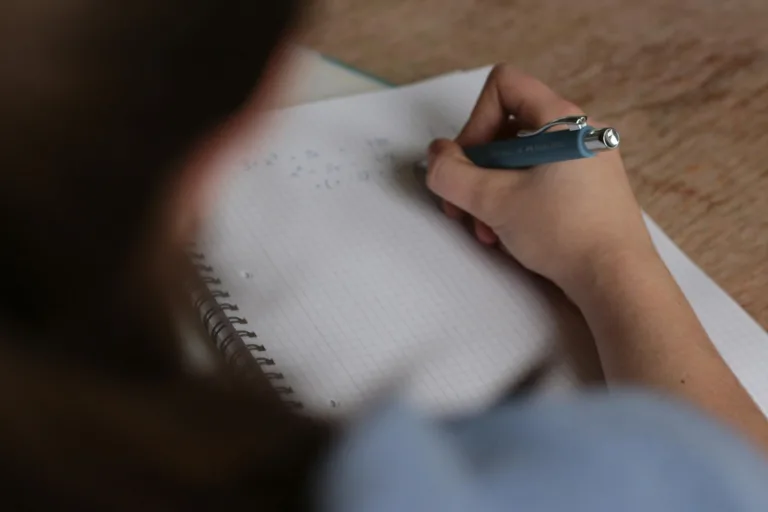왜 인간은 의견의 불일치를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보지 않고 폭력적으로 제압하려 하는가?
다양성은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동체는 생존의 기반이었으며, 조화와 협력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이나 불일치는 종종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고, 이를 제거하려는 폭력적 시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치적 분열, 온라인 혐오, 사회적 배제와 같은 양상으로 의견 불일치에 대한 억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의견의 불일치를 공동체의 건강한 다양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위협으로 간주해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일까요?
1. 생존 본능과 동일성 지향의 진화 심리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낯선 것’을 경계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생각, 낯선 행동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특히 원시시대 소규모 집단에서는 동일한 신념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내부 분열을 막고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 습관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 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집단 내 ‘이질성’을 공동체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2. 교육과 사회 구조의 문제: 비판적 사고보다는 동조를 강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정답 찾기’와 ‘표준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학생들은 질문보다는 암기, 토론보다는 정답을 외우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름 = 틀림”이라는 인식을 낳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동일한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 회사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국민은 단결해야 한다”는 말은 소속감을 고취하지만 동시에 이견을 억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3. 권력과 통제 욕구: 불일치는 권위에 대한 위협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권력이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 가능한 집단’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의견은 토론과 조율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쥔 자에게는 일사불란한 통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의견 불일치를 ‘혼란’이나 ‘도전’으로 해석하고,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제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악플’이나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오프라인에서는 해고, 불이익, 심지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시대, 집단 극단화 현상
인터넷과 SNS는 정보의 다양성을 확대시켰지만, 동시에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보여주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연결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념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인식하는 ‘확증 편향’이 심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다름’을 넘어서 ‘위협’으로 간주되며, 말 그대로 적이 됩니다.
‘다른 생각’이 ‘공격’으로 오해되고, 그에 대한 반응은 설득이 아닌 비난, 조롱,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5. 다양성은 위험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조건이다
실제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공존합니다.
기업도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모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사회는 다양한 관점이 경쟁하면서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의견 불일치를 억압하는 사회는 일시적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내부의 문제를 숨기고 갈등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교육, 정치, 언론 등 모든 구조에서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6.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 실천 가능한 접근
(1) 교육에서 토론과 비판적 사고 중심으로 전환
학생들에게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해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정책 차원의 다양성 포용
다문화 사회, 다양한 성 정체성, 정치적 이념 등을 포용하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 통합’이란 이름 아래 이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개인의 노력: 경청과 질문의 습관
‘틀렸다’는 판단보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자,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다름을 억압할 때, 공동체는 병든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 관점,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견의 불일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제거하려는 폭력적 충동은, 단기적으로는 통제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열과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름을 건강한 공동체의 징후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선,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의 통일이 아니라, 목소리 속의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참고자료
-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김영사, 2013
- 김누리, 『국가가 나서야 할 자존감 교육』, 한겨레 출판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 MIT Technology Review, “The real dangers of echo chambers”
- TED Talks, “Dare to Disagree” by Margaret Heffernan
- 한국교육개발원,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교육’ 연구 보고서
- 《The Atlantic》, “Why We’re Polarized” by Ezra Klein
- 중앙일보, “온라인 혐오 표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인간 본능과 집단 심리 보고서